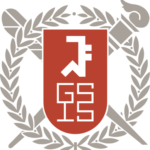Who Picked All the Perilla Leaves?
Who Picked All the Perilla Leaves?
Who Picked All the Perilla Leaves?
By: Choon Hee Woo (Ph.D candidate in Sociology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author of "Struggles with Perilla Leaves: 1,500 Days with Cambodian Migrant Workers")
** 본 센터에서는 ‘내 책을 말한다’처럼 책의 저자에게 본인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글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깻잎투쟁기>의 저자 이우춘희 선생님의 “그 많고 많은 깻잎은 누가 다 땄을까?”입니다.
“언니, 나 하루 10시간 일해요. 한 달에 두 번 쉬어. 계속 깻잎 따. 하루에 15박스. 하루 1만 5천 장 깻잎 따요. 1만 5천 장 깻잎! 깻잎 못 따면 월급에서 돈 잘라요. 기숙사비 잘라. 월급 조금 줘. 근데 사장님이 계속 월급 안줘요. 나 어떻게 해요?”
캄보디아에서 온 니몰 (20대 여성, 가명)씨는 힘주어 또박또박 말했다. 니몰 씨가 보여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 휴게시간’ 이라고 적혀있었다. 즉, 총 11시간 중 3시간 휴게시간을 빼면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적혀있었다. 니몰 씨는 ‘3시간 휴게시간’을 가리키며 “이거 안 맞아요. 사장님 거짓말해요.”라고 힘주어 말했다.
니몰 씨가 한 말 중에서 한 단어라도 놓칠 세라 수첩에 적어 내려 갔다. ‘하루 10시간, 한 달에 이틀 휴일, 하루 15,000장 깻잎, 11시간 중 3시간 휴게시간, 기숙사비, 임금체불.’ 이 단어들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감도 오지 않았다. 나열된 단어에서 느껴지는 노동 강도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하루에 10시간 동안 깻잎만 계속 딸 수 있는지, 정말 하루 15,000장의 깻잎을 따는 것인지 궁금했다. 한 달에 정말 이틀만 쉬는지, 그 쉬는 동안에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다. 사업주들은 임금을 주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노동자를 쫓아낼 수 있는지 궁금했다.
많은 궁금증 앞에 불안이 엄습해왔다. 어디에 가서 누굴 만날 수 있을까? 과연 나를 만나주려고 하긴 할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주노동자들이 깻잎을 따고 있다. 깻잎이 점점 자랄수록 이주노동자의 의자의 높이도 함께 높아진다.

깻잎은 생물이다. 낮에는 자라고, 밤에는 잠잔다. 밤에 자게 되면 잎이 자라지 않는다. 따라서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놓으면 깻잎이 낮인줄 알고 계속 자란다. 이런 깻잎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현장연구로 한발짝을 들여놓으며
며칠 뒤, 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그리고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 날짜가 잡혔다. 그 조사 전 날, 관할노동청 근처로 갔다. 그리고는 혹시나 사업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갔다.
“누구신데 여기에 차를 대요?” 라고 힘이 가득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155cm의 보통의 키에 체구는 작지만 다부진 얼굴을 한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쏘리야 씨를 아세요?”라고 물었다. “우리 애를 어떻게 알아요?”라고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주노동자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이라고 내 소개를 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쏘리야 씨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일 노동지청 조사를 앞두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랐다. 시간이 몇 초 흘렀다. “일단 더운데 들어와요.”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갑자기 신고를 당하고, 조사를 받으러 노동지청에 가는 사업주 또한 황당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업주는 솔직히 말했다. “내가 얘네 입장에서도 생각해봤어요. 멀리서 와서 일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돈이 개입되니까 화가 나죠. 한국에 왔으면 주인 말을 잘 듣고 일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음 날 고용지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농민들은 더이상 농민만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가 된다. 사업주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에는 다들 관심이 없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했다. 막무가내로 “너 꼴도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농장에는 농장만의 법”이 있다며 지켜지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서 “뼈 빠지게 일시켜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할 의무만 있을 뿐, 많은 부분 권리는 보호받지 못했다.
그렇게 김미자(60대 가명) 아주머니를 알게 되었다. 아주머니 댁 옆에 있는 숙소에 머물면서, 숙소비도 낼테니 밀양에서 좀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어쩌지, 새로운 애가 온다고 해서 지금 빈 숙소가 없는데. 그럼 우리 딸 방에서 지내봐요. 지금은 우리 딸이 서울서 취직해서 그 방이 비어있어요.” 그렇게 사업주 집에 머물게 되었다.
농번기의 농촌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 모두들 바빴다. 오죽하면 지팡이를 짚을 힘이라도 있는 할머니도 밭에 나와서 일을 한다고 했다. 사업주들이 바쁜데 인터뷰를 부탁하기 죄송했다. 그래서 낮에는 사업주 옆에서 일을 도와가며 깻잎을 포장하고, 고추선별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궁금한 점을 물으면 어느 새인가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져있었지만 괜찮았다.
저녁에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났다. 대부분 하루에 적어도 10시간에서 많게는 14~15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다들 쉬고 싶어했다. 퇴근 후 모두들 밥 해먹고 잠 자기 바빴다. 어떨 때, 시간을 봐서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하기도 했다. 인터뷰가 잡혔다가도 여러 이유로 인터뷰가 취소되기 일쑤였다. 야근을 해야 해서, 몸이 아파서 못 만난다는 연락도 많이 받았다. 인터뷰 약속을 해서 찾아가면, 어느 새 동네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모여서 음식을 해먹느라고 깊은 이야기를 못 나누기도 했다. 다 괜찮았다. 이런 것도 현장연구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인터뷰 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지금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노오력을 좀 더 하지 않는지 문득문득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래도 이 말을 되새이면서 괜찮다고 나를 다독였다. ‘실패한 현장 연구란 없다!’
하루종일 깻잎밭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저녁에 함께 모였다. 시내에 있는 아시아마트에 가서 장을 봐다가 캄보디아 음식을 해서 먹는다.

좋은 사업주들도 많았지만, 악랄한 사업주들도 많았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았다. 일을 못하면 일당에서 돈을 깎았다. 깻잎 한 줄기를 부러뜨리면 만 원을 내야 했다. 2017년 기숙사 숙식비 징수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냈다. 깻잎 한 상자 (1,000장)에 4,000원으로 계산에서 월급을 주었다. 당연히 최저보다 낮은 임금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쓴 ‘표준근로계약서’는 휴지조각이었다. 사업주들이 ‘이면계약서’를 내밀며 노동자에게 서명하게 하고 이를 강요했다. 사업주의 말이 곧 법이었다.
“가시나들이 돈 벌어줬다 안카나”라며, 많은 사업주들이 아파트도 사고 더 좋은 자동차로 바꿨다. 그러는 동안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조금도 나아가지 않았다. 아니다. 이주인권단체의 눈물어린 노력으로 병아리 눈꼽만큼 정도는 나아졌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노동자들은 20~30대이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한다. 아기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캄보디아에 가서 아이를 친정부모님께 맡기고, 이들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

결국 이야기의 힘이 세상을 바꿀테니까
다행히 내 연구가 ‘서울시 청년허브 공모형 연구’에 선정되었다. 늘 통장 잔고를 헤아려야 하는 박사과정생이지만, 연구비 덕분에 숨통을 트일 수 있었다. 노동자와 사업주를 만나기 위해서 지방에 좀 더 많이 다녀올 수 있었고, 좀 더 길게 머무를 수 있었다. 덕분에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더 많은 이야기가 기록이 될 수 있었다. 서울시 청년허브 연구보고서가 묶여 나왔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기고했다. 그러던 어느날 출판사에서 이메일이 왔다. 함께 책을 내보지 않겠냐며 말이다.
출판은 좋은 기회임을 알고 있었지만, 대중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다. 팔리지 않을 책 때문에 괴로워하고 싶지도 않아서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던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대중서를 쓰고 알리는 일도 연구자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다시 출판사에 연락을 했다. 출판사 사장과 편집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내 걱정을 먼저 내비쳤다.
“사장님, 이 책은 안 팔릴 거예요.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주관련 책이 잘 팔리는 걸 못 봤어요. 결혼이주여성이라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좀 더 친근할지 모르지만, 농업노동자들은 전혀 몰라요. 독자들은 동아시아라면 모를까 동남아시아 중에서 캄보디아는 생소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요리나 맛집, 먹방이라면 모르겠지만, 다들 농업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농업, 이주노동, 캄보디아, 이렇게 삼박자가 골고루 맞춰져서 책이 안 팔릴 거예요.”
사장과 편집자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느꼈다. 책에 관해서 모인 자리에서 저자가 적극적으로 책이 안 팔릴 거라고 호소를 하니 당황해하는 것은 당연했다. 출판사도 당연히 이를 모를리 없었다. 그래도 책을 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1년 뒤 책이 나왔다. 정말이지, 딱딱한 내 문자들이 편집자의 손을 거쳐가니 가독성이 쉬운 글로 변신했다. 많은 부분 재배치되었다. 대중서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뺐다. 편집자도 또 하나의 저자였다. 다행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다. 여러 주간지에서 발빠르게 저자 인터뷰를 담아주었다. 독자와의 만남도 가졌다.
토마토 선별작업을 하는 이주노동자들. 농민들은 입을 모아 “이제는 외국인 없이 농사 못 짓지”라고 말한다. 여러분의 밥상에 오르는 대부분 음식은 이주노동자 손을 거쳐 온다.

독자들과 만나면서 많은 질문들이 오고갔다.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질문을 뽑으라면, 내가 대답하지 못하지만 이 질문을 뽑고 싶다. “지금 내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할 수 있을까요?” 독자들과 함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책 『깻잎 투쟁기』 를 썼다. 이 블로그를 읽는 독자들도 이주노동자들의 눈물로 차린 밥상에 담긴 이야기에 귀기울여주길 부탁드리고 싶다. 그리고 매일 밥상을 차리는 손을 살포시 잡아달라고 부탁드리고도 싶다. 이야기를 하고 귀기울이면서, 결국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